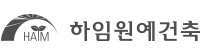1일 오전 아시아경제 사옥에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oreo 작성일25-05-02 21:47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일 오전 아시아경제 사옥에서 바라본 충무로 하늘. 이경호 기자 1일 오전 수도권 곳곳에서 기괴한 모양의 구름이 관측됐다. 일반적인 구름은 햇빛에 비친 부분이 하얗게 빛나며, 구름 밑면은 어둡고 편평하다. 그러나 이날 하늘은 거친 바다와 같았다. 파도를 치는 듯한 두꺼운 구름이 하늘을 덮었다. 1일 오전 아시아경제 사옥에서 바라본 충무로 하늘. 이경호 기자 구름은 기체, 액체, 고체 등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다. 기체인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지고 이슬점에 도달하면서 수증기를 만든다. 이때 생긴 작은 물방울(액체)과 얼음(고체)이 모여 구름이 된다. 구름이 무거워지면 비가 된다. 구름의 평균 수명은 10분으로 알려져 있다. 파도가 요동을 치는 듯한 구름. 2009년 6월 구름감상협회에 올라온 구름이다. 이후 아스페라투스 구름이라고 국제구름도감에 등재된다. cloud appreciation society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관측된 구름은 '거친물결구름(Asperatus)'으로 불린다. '거친, 울퉁불퉁한'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아스페리타스(asperitas)에서 유래했다. 반포한강공원을 찾은 한 시민이 뭉게구름을 촬영하고 있다. 이런 구름이 일방적인 구름이다. 아시아경제DB 이름의 출발은 이렇다. 2009년 6월 구름감상협회(cloud appreciation society)의 '이달의 구름'에 올라온 사진은 파도가 치는 바다의 표면을 닮았다. 1970년대 프랑스의 전설적인 잠수부이자 생태학자인 자크 쿠스토의 이름을 따서 '자크 쿠스토 구름(Jacques Cousteau cloud)'리는 별명을 붙였다. 그러다 전 세계의 회원과 방문자로부터 비슷한 사진제보가 쏟아지자 라틴어로 거칠고 고르지 못하다는 의미로 'undulatus asperatus'로 명명했다. 이후 2017년 국제구름도감에 실리면서 약칭(Asperatus)으로 쓰이게 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나는 헤어드라이어를 안 쓴다. 친환경 실천보다 드라이어로 머리 말리기가 더 귀찮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텀블러와 접이식 용기를 들고 다니고 8층까지 계단을 오른다. 텀블러는 보온·보랭에 탁월하고, 계단은 공짜 헬스장인 셈이고. 용기에 리필하면 탄소중립 포인트로 2000원을 환급받으니 좋다. 그리고 허벅지에 바늘 꽂는 심정으로 참아내는 환경 실천이 있으니, 바로 비행기 안 타기다. 이 지면에 ‘최소 3년은 비행기 안 타!’라고 두 번이나 선언했는데, 온 동네 소문내서 안 타보려는 안간힘이었다.단, 해외여행에 한해서다. 국내선 안 타기야 식은 죽 먹기지. 비행기는 이착륙 때 ‘끙차’ 온 힘을 내므로 에너지 소비가 많다. 그 결과 단거리 비행의 마일당 탄소 배출량은 장거리 비행보다 70%나 많다. 다행히(?) 한국은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넓은 대륙도 아니고, KTX가 있는 나라다. 제주도만 빼면 육상 교통만으로도 지역 간 이동이 쉽다. 그런데도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KTX가 더 비싸서, 혹은 기차표가 매진돼서라고 했다. 보안 검색과 체크인 시간, 공항에서 시내까지 오는 시간 등을 따지면 사실상 비행기가 더 빠르지도 않아서 굳이 탈 이유는 없단다. 더 저렴하고 더 쉽게 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굳이 비행기를 탈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말이 쉽지 뭔 돈으로 기차와 버스를 더 저렴하게 더 자주 운영하냐고 물으신다면, 신공항 지을 돈으로 하면 된다고 하겠다. 국토교통부는 10개의 신공항 건설을 고려 중인데, 건설비만 40조원이 넘는다. 특히 갯벌과 습지를 메워서 짓는 가덕도, 새만금 공항 등은 땅꺼짐으로 인해 유지보수비가 더욱 불어날 예정이다. 갯벌을 메워 야영장 지어놓고 국격이 ‘폭망’한 잼버리 사태의 공항 버전 아닌가. 이미 전국에는 15개 공항이 운영 중이며, 이 중 11개는 수요가 없어 한 해 1400억원의 만성 적자가 쌓이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 근처 군산공항의 2023년 활용률은 단 0.8%였다. 신공항 사업들에 사업성이 있다며 예측한 수요대로라면 국내선 이용객은 국내 인구의 2배인 1억명이 될 전망이다. 이게 말이야, 인해전술이야. 더구나 새만금, 제주, 가덕도 공항 등은 철새 도래지에 위치하며, 일부 예정지는 제주항공 사고가 난 무안공항보다 조류 충돌 위험도가 650배나 높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고객지원 >
> 고객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