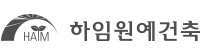Alzhe
페이지 정보
작성자 oreo 작성일25-05-17 10:59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Alzheimer's Disease Awareness and dementia illness as a mental health concept as a burning tree shaped as a human head with 3D illustration elements. 한국 사회의 뇌졸중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나 다양한 위험인자에 대한 이해 수준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정보 습득 경로가 TV, 신문 등을 통해 비교적 정확하고 일관되게 전달됐지만, 인터넷과 유튜브 등의 비중이 늘면서 단편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을 통한 정보가 전달됐기 때문이다. 또 많이 알수록 적기(골든타임)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 초기 치료법인 ‘정맥 내 혈전용해술’(IVT)과 ‘2개 이상의 경고 증상’을 인식하고 있는지가 초기 119 신고 확률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정근화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와 이응준 공공임상교수팀은 2009년과 2023년 뇌졸중 인식 수준을 비교한 결과가 미국심장협회지 ‘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09년과 2023년 두 시점에서 뇌졸중 인식 수준을 비교한 전국 단위 조사다. 2009년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2023년에는 10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웹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은 ▲뇌졸중 경고 증상 ▲위험인자 ▲치료법 ▲증상 발생 시 적절한 대응에 대한 인식을 평가했다. 연구 결과, 2023년에는 뇌졸중 경고 증상에 대한 인식이 77.4%로 2009년(61.5%)보다 15.9%p 증가했다. 하지만 뇌졸중의 위험인자에 대해 2개 이상 알고 있는 인식은 51.4%에서 40.2%로 감소했다. 특히 혈관 위험인자가 없는 집단에서 인식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는 여전히 정보 취약 계층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같은 정보의 단편화는 정보 습득 경로가 변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TV를 통한 정보 획득 비율은 2009년 59.1%에서 2023년 48.5%로 감소했지만 인터넷(27.8%→63.0%)과 유튜브(0%→19.9%) 등 디지[창간 30주년 기획] 성역이었던 언론계 비판하며 존재감 드러내...미디어 환경 변화 흐름 속에 비평과 취재 대상 넓어져[미디어오늘 장슬기, 정철운 기자] ▲미디어오늘 30주년 로고. '언론의 언론'은 어떻게 출발했나미디어오늘 창간 배경을 보려면 1994년 6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독재·반공세력과 타협한 김영삼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강경 진압 기조를 유지했고 노동계는 민주노조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당시 어용으로 평가받던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민주화하자고 주장했지만 상당수 노동자들은 새로운 민주노조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공권력은 서울신문 파리특파원 출신이자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공동대표였던 권영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론노련) 위원장을 예민하게 주시했다. 노조 활동 상당수가 불법이던 시절 권 위원장은 다른 사업장 노동자의 연대를 불법화하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2006년 폐지)'으로 수배 대상이 됐다.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은 실패로 돌아갔고, 권 위원장은 수배 생활을 지속하다 서울신문에서 해고됐고 끝내 구속됐다. 당시 조선일보 등 주요 신문사들이 소속된 언론노련 위원장이 노동사(史) 한 대목을 쓰고 있었지만 대다수 언론사는 소극적으로 보도하거나 권력의 관점으로 사안을 다뤘다. 1987년 6월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진행하던 '민주 언론 만들기'의 한계였다.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언론계엔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87년 10월 한국일보 노조 출범을 시작으로 주요 언론사가 노조를 만들었고, 1988년 언론노련 결성과 함께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해 한겨레신문을 창간했다. 각 지역에선 1988년 홍성신문을 시작으로 1989년 옥천신문 등 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한 풀뿌리 지역신문이 등장했다. 언론노련은 1989년을 '언론해방투쟁' 원년으로 선포하고 노조 사수와 편집권 독립을 내걸고 투쟁을 이어가 1993년 법원에서 '합법노조' 지위를 받아냈다. 그런데 이듬해인 1994년 권영길 위원장을 비롯해 언론노련 산하 신문·방송 노조위원장들까지 철도노조 연대를 위한 철야농성에 참여했지만 어느 언론에도 기사 한 줄 나가지 않았다. 이에 언론노련을 중심으로 언론계의 잘못된 내부 관행을 알려야겠다는 문제의식이 커졌다. 독재정권과 유착되면서 형성돼 온 잘못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고객지원 >
> 고객지원 >